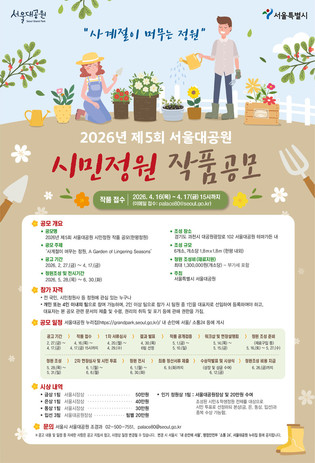|
| ▲ |
정년과 장보고와의 관계이다. 즉 《三國史記》를 보면 장보고 정년전은 《新唐書》의 글을 전재하여 한둘의 자구를 보충해 넣거나 혹은 삭제한 것에 지나지 않으나 정년의 년(年)은 혹은 연(連)으로 쓴다(『張保皐關係硏究論文選集』, 2002 참조).
이 명칭은 《三國史記》가 《新唐書》를 전계하기 이전에 이미 한반도인 들이 정년의 이름을 쓰고 있었다. 김양전(金陽傳)은 그 비문을 자료로 했다. 《三國史記》 본기와 김양전에 보이는 정년의 이름은 여섯 효용한 장수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나 정년의 일은 신라에 따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김양전(金陽傳)에 보이는 ‘개성 3년 3월에 강한 군사 5천인으로 무주를 습격하여 성 아래에 이르러 주 사람이 다 항복하였으니 남원에 유숙하여 신라의 군병을 맞아 싸워 이겼다. 그리하여 김우징(金祐徵)이 사졸들에게 오래 노고했다. 그는 청해진에 돌아가 군병을 양성하고 말을 먹이었다’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본기에는 ‘군병 5천을 나누어 그의 벗 정년에게 주고 이르기를, 그대가 아니면 누구도 능히 화란을 평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본국의 전하는 바를 버리고 《新唐書》를 취한 것이라 사료된다(『張保皐關係硏究論文選集』, 2002 참조).
특히 장보고가 죽은 뒤, 이어 가름한 것은 염장인데 정년 등의 여섯 효용한 장수의 한 사람인데, 정년과는 온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를 생각건대 정년의 일은 장보고가 기한(飢寒)의 옛 동료를, 옛 분노를 잊고 용서하여 좋은 위치를 주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이 과장되고, 극적으로 당에 전해진다.
그렇다면 장보고의 죽음에 대하여 《三國史記》에 의하면 염장은 빈손으로 홀로 장보고의 자리에서 그를 목을 베고 난 뒤에 그 무리를 불러 설득하니 엎드려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와 다른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기사내용이다(『張保皐關係硏究論文選集』, 2002 참조).
특히 앞에서 언급한 고서를 살펴보았듯이 장보고와 정년 두 사람은 당에서 무령군 소장이 됐다. 장보고가 신라로 온 뒤에 정년은 당에서 불우한 생활을 참지 못하고, 청해진으로 귀환하여 장보고와 같이 동고동락했다. 그리고 장보고가 우징을 도와 민애왕을 공격할 때, 장보고는 정년에게 군사를 내어주었다. 즉 위기의 순간에 장보고에게 있어서 믿을만한 인물이 정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장보고 사망 이후 정년 그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의문이다. 만약 당시에 정년이 생존하였다면, 그 시대의 정치적 사항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보다는 일본으로 망명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그 이유는 당에 있을 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장보고와 자각대사(慈覺大師) 엔닌(圓仁)과의 관계, 즉 《入唐求法巡禮行記》의 고서를 보아도 아마 일본으로 망명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를 증명하듯이 그 당시 염장의 탄압에 의해 신라인들이 일본으로 망명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을 볼 때, 장보고의 전기(傳記)는 당에서 장보고, 정년전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래되어 여러 고서에 재인용되고 있다. 만약 장보고가 이 나이에 일생을 마감하지 않았더라면, 청해진이 더욱 발전하여 신라라는 나라가 한.중.일 삼국 중에서 가장 거대한 왕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장보고의 시대에 보이는 무예 역시 더욱 발전 전래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흔적들은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 이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장보고의 죽음은 신라 해상의 존속과도 부합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다. 신라인으로서 일본에 온 이소정 등은 장보고의 암살 후, 염장에게 가담함으로서, 신라본국(新羅本國)과 관계를 지속하여 해상무역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장보고 후예들은 고난을 이기지 못한 채 중파 적산궁(赤山宮)의 엔닌(円仁)에게 요청하여 망명하는데, 이 사람들을 일본의 시가현으로 이주하여 신라계도래인(新羅系渡來人) 거주지를 형성했다.
이러한 사실은 적성대명신연기(赤城大明神緣記)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과 같이 장보고는 적산명신(赤山明神) 적신(赤神) 혹은 적신명신(赤神明神), 또는 신라명신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엔닌과(円仁)의 밀접한관계로 인하여 후에 적산명신(赤神明神)은 엔닌문도(円珍門徒)로부터 왕성한 숭배를 받게 된다. 다시 산문엔인문도(山門円仁門徒).사문엔진문도(寺門円珍門徒)의 대립에 즈음에 하여, 사문측이 그 수호신으로서 張保皐(新羅明神)를 숭배하고 공적인 후대를 요구하였으며, 일본의 무사도(武士道) 시조 미나모토(源) 가문에서 신적인 존재로 숭배됐다. 또한 가마쿠라(鎌倉) 시대에서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이르는 수점의 신라명신(新羅明神)상으로 숭배되고 있다. 그리고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 시대의 여러 고류유술(古流柔術) 『비전서』에서도 신적인 존재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장보고(張保皐, 張寶高)는 신라명신(新羅明神)과 동일 인물로서 한.중.일 삼국의 해상을 평정한 불세출의 인물이다. 즉, 《三國史記》, 《新唐書》, 《樊川文集》 등의 고서에서 신라 장보고를 고류유술의 원류인 격투술의 투전(鬪戰)을 잘하고 활을 잘 쏘며, 학문이 뛰어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장보고가 당에 가서 무녕군소장(武寧軍小將) 번진(藩鎭)의 장교로 있었으며 장보고가 산동반도 문등현 적산촌(赤山村)에서 지주장전(地主莊田)을 경영하고 대규모의 법화사원을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엔닌(圓仁)도 일본에서 시가현 오츠시에 중파 적산궁(赤山宮)을 설립하고, 신라명신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숭배했다. 이 지역은 신라계도래인의 거주지였고, 원성사(園城寺)에는 신라선신당(新羅善神當)이라는 산신각(山神閣)이 있다. 특히 엔닌(慈覺大師)은 《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오골강(烏骨江) 《道理考實》에서 압록강구의 서쪽의 가까운 지역을 대동구(大東溝)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칼럼 편에서 계속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