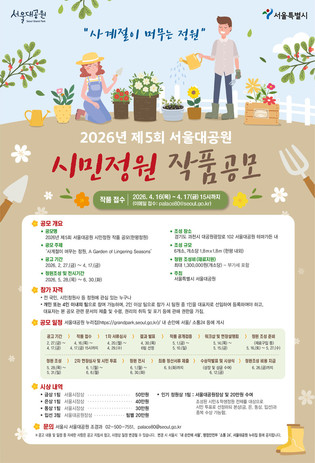|
|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어떻든 여·야는 국민의 뜻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지난 촛불 집회에서 국민들은 실질적 국민주권 보장을 외쳤건만, 정치권은 전혀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주권자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이익 확보에 혈안이다.
주권자 국민 실종 정치가 만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촛불집회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구호는 국민주권이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강행한 국회가 국민을 망각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주권자 국민을 망각한 국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4월 11일은 임시헌장이 임시의정원(국회)으로부터 의결된 지 100년이 된 날이다. 100주년 기념으로 임시의정원 정통성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국회도서관 주최로 지난 4월 9일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 국회 뿌리를 찾아보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필자는 3.1운동 판결문에 대해 약 30년 동안 연구한 사사가와 노리가츠 교수의 발표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서 필자의 의견은 임시의정원 정통성에 대해 새로운 헌법학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3.1운동을 단순히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국민운동, 나아가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국민으로 승격하려는 국민주권 운동, 즉 혁명으로 봐야 한다. 임시정부는 혁명정부이고, 임시의정원은 헌법제정 국민회의다.
하지만, 임시의정원이나 임시정부에 대한 기존의 헌법적 입장은 그게 아니었다. 즉, 식민지 이전의 정부로부터 계승된 정부인지, 아니면 식민지 이전의 정부와 무관계 망명 정부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인지, 1948년 제헌헌법 제정으로 정부수립인지. 이런 논란이다.
현행 1987년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국가임을 헌법 전문에서 선언한 것으로만 헌법학에서 보고 있다. 이런 선언적 의미보다 권력분립 및 의회민주주의 등, 입헌주의 측면에서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정통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임시헌장은 아래로부터 헌법이기 때문이다.
1899년 대한제국의 국제는 대한제국 황제가 위에서 신민(백성)에게 내린 제정한 흠정헌법입니다. 이 국제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①제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 ②임시의정원(의회)의 제도화, ③황제 주권을 버리고 국민(인민)주권을 도입, ④신민에서 인민으로 바뀌고 남녀평등, 인권 보장 ⑤인민의 선거권 보장 등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19년 임시헌장이 제정된 직접적 원인은 3.1운동이다. 3.1운동은 민중의 자발적 평화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민중이 자발적 참여로 1919년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면, 아래로부터 헌법이다. 전체 국민이 참가한 3.1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해 아래로부터의 헌법이 제정되어 권력분립의 입법기관인 의회로서 임시의정원이 설립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프랑스혁명 당시 이론가인 시에예스의 헌법제정권력 이론에 합치된다. 시에예스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헌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전체 국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한다.
더구나 1919년 4월의 임시헌장, 동년 9월의 임시헌법 등은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100년 전 임시의정원은 헌법제정 국민회의로서 정통성이 분명하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사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제정권력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임시의정원을 헌법제정 국민회의로서 본다면 문제는 전 국민의 대표성이다. 과연 임시의정원이 당시 식민지 조선의 전 인민을 대표하느냐는 문제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을 진행형 헌법제정권력이라고 부르고 싶다. 원래 “임시”라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잠정적인 진행형을 뜻한다.
또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판결문에서 발굴해 학술대회에서 사사가와 선생이 밝힌 “연통제” 사건을 보면 전 국민의 대표성이 분명하다. 임시의정원은 면단위까지 식민지 조선의 지방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것이 일제 식민 경찰에 발각되어 기소된 사건이다.
끝으로 주목할 점이 있다. 처음부터 임시의정원이 추구한 것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적 독립이었다. 1919년 4월11일 임시헌장 제7조에 평화 사상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평화 추구 사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2016년 세계도 주목한 평화적 촛불집회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주권을 확립하려는 평화적 헌법제정권력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헌법제정권력이 완성되려면 통일헌법의 제정이 돼야 한다. 남북한 국민이 평화적으로 참가한 국민회의에서 남북통일 평화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완결할 수 있다. 남북한 평화헌법을 위한 헌법제정 국민회의 시발점으로서 1919년 발족한 임시의정원의 정통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며, 헌법이다. 그런데 국민과 헌법을 망각한 국회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다시 헌법제정 국민회의를 조직해야 한다. 이 점을 국회는 엄숙히 받아들여야 한다.
<조규상 박사 재정경영연구원장>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