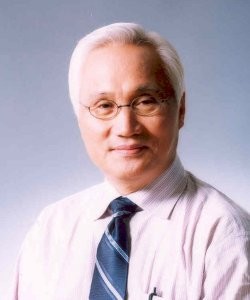 |
| ▲이학박사 최무웅(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미세먼지(PM2.5) 발생은 지구와 더불어 발생해왔지만 중국에서 비상하는 흙먼지가 주기적 즉 기후변화와 더불어 발생해온 것은 오랜 지구역사이기도 하다. 인구밀도가 조밀하면서부터 먼지에 대한 대책이 중요시 되어 2019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적으로 대응대책을 하게 되어 마음만이라도 안전성을 확보한 것 같아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의 강도가 안심하게 되었지만, 초기라서 관련주체가 예보하고 각자 개인이 대책 즉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전부처럼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미세먼지의 무서움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건강에 큰 충격을 가하며 지구 지표면에 퇴적을 1년에 1mm두께로 계산한다면 미세먼지가 1mm(1년) x 1억년은 대단한 두께의 미세먼지 지층이 형성된다는 계산이다. 우리가 1년에 1mm의 미세먼지가 퇴적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심각한 지구지표면의 퇴적이라는 것은 1억년이라는 긴 세월은 대단이 많이 미세먼지가 쌓이게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1억년 동안 먼지가 쌓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지층의 형성은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이런 것을 예측하는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현재 미세먼지로 심각한 충격을 받는 곳은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와 더불어 면역성이 낮은 노령자들의 모임인 경로당이 1차 대응대상이며, 2차 대응 대상은 직장인의 건물과 일터일 것 이다. 그러므로 1차 대상은 그들 스스로도 미세먼지를 생산하기도 하기에 미세먼지 대응 즉 건물 밖의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차단만이 아니라 환기와 더불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일정한 수치 이상일 경우는 자동으로 환기되면 학교단위로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위에 열거한 1차 대응대상과 2차 대응 대상 망을 구성한다면 미세먼지 대응대책으로 건강한 교실이 될 것이다. 또 도시 교통로의 미세먼지 대응은 현재 정차지에 물을 나노화하여 미세먼지를 바닥과 공기 중을 방지하지만 겨울철은 혹한으로 인한 동결방지 친환경적 물을 방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겨울철은 버스스톱에 물 분사를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1차 대상 건물의 미세먼지 대응대책은 교실로 친입한 미세먼지 방지망을 설치한 것을 미세먼지 없는 날은 환기 할 수 있도록 밀창형 미세먼지 망을 설치하고 각 교실마다 미세먼지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이를 모니터링 자동화를 기하고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가 안심할 미세먼지 량인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교실마다 화면설치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어린이집,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노인정까지 미세먼지 대응을 한다면 건강한 세상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미세먼지 대응에 여러 방법으로 대응을 제안하고 있지만 위에 열거한 기본적 방법으로 미세먼지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다.
제1차가 성공하면 당연이 2차 방법으로 기타 열린 도시지역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법을 더 편리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24시간 고정 형과 이동 형으로 나누어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거리에 표시되어 있는 환경 판에 24시간 표현되므로 안심하고 도시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 대표, 세계타임즈 고문, 구리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 위원장. mwchoi@konkuk.ac.kr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