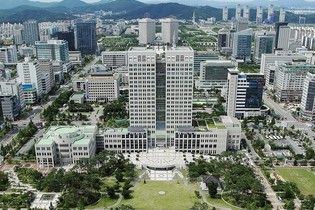|
| ▲ |
우리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속담처럼 나 아닌 네가 그러니 온간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것도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 한 도저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되는 꼴을 못 본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이다.
세상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강자존 지금도 그렇다. 이것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하지만 무엇이 자랑스런 민족인지 설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마당치 않다는 것은 약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는 한마디로 말할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국민성과 깊은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148번지에 삼전도비(三田渡碑) 침략자의 공덕비는 약자라는 증거이다. 자존심도 없는 왕이 이마에서 피가 흐르도록 9번이나 맨땅에 헤딩했다면 남자 담게 활복 자살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보여주지도 못한 비겁한 정신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전 특사가 서로 다른 정보보고에 정치세력의 힘에 눌린 왕으로 인해 힘이 없어 나라를 팔아먹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정복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인간으로의 인권이 어디 있었나요, 그러면서 나라를 찾아야하다는 명분으로 자금을 보낸 결과는? 우리가 싸워서 인간으로의 수모를 겪어 왔던 36년간 합병의 굴레에서 벗나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란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강자들의 전쟁에서 원자폭탄에 의해 승패가 나는 바람에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을 3년간의 여유가 있는 데도 즉각 나라를 못 세운 이유는 냉정히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것은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 항복자에 속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을 아무리 각색해도 역사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진실이기에 그런 것 아닌가요.
승자의 힘으로 아니 그들의 배려로 3년 후 합법정부가 출생한 생생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왜 노벨상과 무슨 관련 있어 역사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겠지만 이런 것이 노벨상과 관계가 있는 것 즉 과학의 노벨상을 못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깊이 생각하면 음 그렇치 할 것 입니다. 같이 항복한 자로 함께 출발했는데 비교하면 우리는 평화 이외의 그 어느 분야도 노벨상이 없는 것은 민족성이라고 남 탓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현주소, 미래도 가능성 없는 것은 아직도 정신적 역사적의 굴레에서 독립을 못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벨상을 못타는 것은 역사는 역사라고 매듭짓고 그 비참하고 참담한 세월의 강도를 생각하여 끈질기게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이 기회만 노려온 결과라고 일찍 깨달았어야 하는데 아직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노벨상과는 점점 거리가 먼 상황이다.
노예보다 더 강한 삶을 경험한 것은 가난이라고 생각하여 경제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아직 자존심과 긍지는 회복치 못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노벨상도 역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불의가 정으로 둔감하면 그 싸움에서 살아 남으려고 기회를 노려왔기에 물을 찾는 샘을 깊이파지 못하고 여기저기 조금씩 파다가 물 안 나온다고 또 다른 곳으로 이러한 결과가 70년간이라는 세월동안 지식으로 자존심과 긍지를 만들어오지 못한 것은 공동의 책임 아니 리더의 책이겠죠.
이제 밥 먹고 살만하니 나보다 네가 잘되기를 바라고 잘되면 축하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노벨상이 나올 것이라고 강하게 예측합니다. 이제 우리는 썩은 정신의 마음을 이노베이션 하여 제4차 산업혁명사회서는 자존심과 긍지를 지켜야한다면 기대해볼 만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너도 나도 서로 서로 돕고 힘을 합치면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는 제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보라는 듯이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음혁신의 미래가치 창출이여야 한다. 그러므로 노벨상에 도전하지 않아도 그저 굴러 올 것이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대표, 세계타임즈 고문(mwchoi@konkuk.ac.kr)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