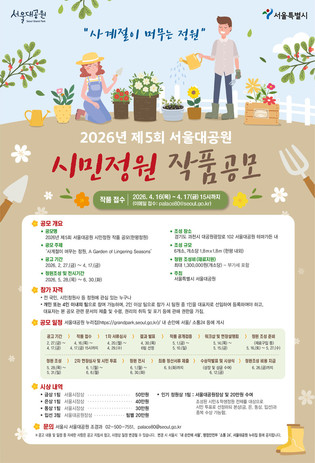|
|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
옛 선조들의 고서화에 등장하는 무형의 신체동작은 우리 후손들의 자산이요, 우리 미래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이 주안점은 전통 「武藝」의 실제에 대한 전승 및 계승 그리고 재현과 복원 그리고 연구를 통해 무형의 문화유산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를 계승·발전 시켜야할 근본적인 목적이 무예실제와 사상에 관한 인간형성의 극치와 이치이다. 여기에는 무한한 ‘전통신체문화유산’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 후손들은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신라시대의 '화랑세기'는 선도, 무도라는 용어 이외에도 특정한 「武藝」의 측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화랑세기'가 7세기경에 집필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무사도라는 문구의 발생지는 일본의 무사도가 아니라 신라에서 발생한 무사도로 보아야 한다. 신라시대의 위대한 유산으로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상무정신’과 ‘무사도 정신’을 손꼽을 수 있다.
이 위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우리 민족의 초석이 되었으며, 민족단일공동체 결집의 장이 된다. 그렇다면 신라는 어떻게 상무정신과 무사도의 사상을 탄생시켰는가! 그들의 고유한 무예를 통해 무사도를 완성시켜 왔다. 그것은 바로 화랑도라는 청년 전사 집단의 무예교육이 있었기 가능한 일이었다.
신라의 선(仙)은 ‘선도(仙徒)의 선’으로 원래 이들은 신궁에서 신에게 봉사하는 무리들이었다. 옛날에 선도는 당시 신을 받드는 일을 주로 하였는데 국공들이 신을 숭상하기 위한 후부터 선도들은 도의(道義)를 서로 힘썼다. 이처럼 세계최고 무도의 메카(Mecca)인 용인대학교의 건학이념도 '도의상마 육이위인(道義相磨 欲而爲人)이다. 즉 그들은 나라가 위급하면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기도 하는 그런 전사단의 선(仙)이기도 했다. 이것은 ‘호국선’, ‘무도’, ‘검도’란 용어가 이들 선과 결합된다.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에 우리의 민족성을 하나로 집결하는 장이 되며 밖으로는 당과의 관계를 한층 더 친밀한 관계로 유지한 결과 해상 무역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는 화랑들의 무예수련을 통해 상무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연의 『三國遺事』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진흥왕이 또 생각하기를, “나라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리어 양가의 아들 가운데 덕행 있는 사람을 뽑아서 화랑이라고 고쳐 불렀다. 처음에 설원랑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의 비석을 명주에 세웠다. 이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고쳐 선으로 옮기게 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아랫사람에게 부드럽게 하니 이것이 오상(仁, 義, 禮, 智, 信)이다.
또한 화랑도의 정신을 집약한 세속오계 화랑도의 정신적, 윤리적 지향점은 명확하다. 『三國史記』 열전에는 원광법사가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귀산과 추항, 두 청년에게 내린 세속오계에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첫째, 임금을 섬김에 충으로써 해야(事君以忠)하고, 둘째 어버이를 섬김에 효로써 해야 하고(事親以孝), 셋째 친구를 사귐에 믿음으로써 해야 하고(交友以信), 넷째 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臨戰無退), 다섯째 생명을 죽임에는 가려서 해야 한다(殺生有擇).
이러한 신라의 화랑도 상무정신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화랑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생긴 살아있는 상무정신이다. 지금도 살아있는 선조들의 이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당연하다. 신라시대의 화랑들은 이 상무정신을 통해 국가의 안위를 위해 각종 무예 수련을 연마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무사도 정신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라 화랑도의 상무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신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가 바로 불세출의 명장 장보고(신라명신)이다. 장보고(신라명신)에 대한 명칭은『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궁복이나 궁파라고 되어있고, 엔닌(圓仁, 慈覺大師)의 『行記』와 『續日本後紀』에서는 장보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新唐書》 <新羅人張保皐>의 기록에는 실전 격투유술인 투전(鬪戰)과 학문의 깊이가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장보고는 격투(투전) 고류유술 실전 무예가 뛰어나고 또 말을 타고 창을 던지면 신라와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는 무패신화의 인물이다. 《新唐書》의 신라전(新羅傳)에는 “장보고는 모든 실전격투 고류유술(투전 : 鬪戰)을 잘하고, 창 쓰는 법에 익숙하여 상대할 사람이 없다(《新唐書》, 卷二百二十列傳第一百四十五, 有張保皐鄭年者皆善鬪戰工用槍年不復能沒海履其地五十里不噎角其勇健保皐不及也年以兄呼保皐保皐以齒年以藝常不相下自其國皆來爲武寧軍小將).
특히 신라 장보고는 동아시아 물론 세계에서 전장의 무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가 죽은 후, 후예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전승되어온 실전격투 투전(鬪戰)인 고류유술에는 죽내류, 소률류, 황목류권법, 제강류, 관구류, 삽천류, 기도류, 양심류, 천신진양류, 보과근덕 황목류권법, 대동류 등이며 이 고류유술을 종합하여 재정립한 것은 강도관유도이다.
신체기법은 백타(白打), 권법(拳法), 포수(浦手), 취수(冣手), 화술(和術), 소구족(小具足), 기(氣), 요회(腰廻) 등이다. 그들의 고류유술 기록의 죽내계서고어전기에는 인왕, 청화천황, 정순친왕, 경기 육손왕, 시조, 원씨 천신진양류 가전서에는 원정덕, 원정족 원씨, 관구류 가계에는 청화원씨, 팔만태랑의가 등 신라계 성씨가 존재하며 신라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1988년 시오자와 유타카인(塩澤裕仁)에 의하면 적성대명신연기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과 같이 장보고(신라명신)는 적산명신 적신 혹은 적신명신이라고 불린다. 엔닌(圓仁)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후에 적산명신은 엔닌문도로부터 왕성한 숭배를 받게 된다.
다시 산문엔인문도, 사문엔진문도의 대립에 즈음에 하여, 사문측이 그 수호신으로서 장보고(신라명신)를 숭배하고 공적인 후대를 요구하였으며 일본 내에서 신적인 존재로 숭배된다.
또한 장보고(신라명신)가 당나라에 가서 무녕의 군(藩鎭의 장교)으로 있었으며 장보고(신라명신)가 산동반도 문등현 적산촌에서 지주장전을 경영하고 대규모의 법화 사원을 지었다. 엔닌(圓仁)도 그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시가현 오츠시에 중파 적산궁을 설립하였으며 신라명신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숭배했다. 특히 다께다(武田) 가문의 시조는 신라사부로(新羅三郞)라는 이름의 무사이다. 다께다(武田) 가문의 시조가 신라사부로라는 것은 일본 무사의 뿌리가 신라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미나모토 요시미쓰(源義光)가 본인의 성을 미나모토(源)가에서 신라사부로 요시미쓰(新羅三郞源義光)로 바꾸어야 하였을까! 이는 일본 오미(近江)지방의 비와 호수변 도시 오쓰(大津)의 사찰 미이데라(三井寺)에서 이에 관한 기록이 있다. 신라사부로의 아버지 미나모토 요리요시(源賴義)는 1051년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 미이데라(三井寺)의 신라선신당 앞에서 신라 장보고(신라명신)에게 승리를 기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미나모토 요시미쓰(源賴義)를 신에게 바친다고 맹세한다. 그는 기원대로 승리를 거둔 후에 셋째 아들 미나모토 요시미쓰(源賴義)를 데리고 와서 성인식을 올린 후 아들 이름을 개명한다.
당시 무사들의 무예 수련을 중요하게 여겼던 미나모토 요리토모(源賴朝)는 병사들에게 투전(鬪戰)인 무가상박(武家相撲)을 장려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나모토 요리토모(源賴朝)의 선조가 신라사부로 요시미쓰(新羅三郞源義光)이며, 이 가문의 조상은 신라계도래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고쿠조쿠(小具足) 구미우찌(組討)의 일본 무예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 무예가 훗날 고류유술의 시초가 된다.
장보고(신라명신)의 상징물과 신라삼랑원의광, 무전신현 등 상징물(깃발) 무늬가 동일하다. 특히 16세기 신라삼랑원의광의 후손 중 다께다 신겐(武田信玄)은 전국시대의 불세출 무장으로 유명하다. 그는 군기에 신라삼랑원의광이라 표기했다. 여기서 장보고(신라명신) 위패를 모시던 절 적산궁의 상징물과 군기에 있는 상징물 무늬가 같다는 것은 신라계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그리고 다께다 신겐(武田信玄)은 기마전술에도 능했는데, 가마쿠라(鎌倉) 막부(幕府)를 세운 미나모토(源) 가문도 기마전술이 뛰어난 가문이었다. 이들의 선조가 되는 신라인들도 흉노 기마민족의 혈통인데 그 피를 이어받는 신라계도래인도 기마전술이 능통했다는 기록이 고증문헌에 등장한다. 이 지역은 신라계도래인의 거주지였으며 원성사에는 신라선신당이라는 산신각이 있다.
그 뒤에는 신라삼랑원의광의 묘가 있는데 이는 토분을 쌓은 전형적인 신라시대의 양식이다. 또한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鎌倉) 막부가 성립(1198)되던 시기에 일본 천태종의 좌주였던 자원은 그의 저서 『우관초(愚管抄)』에서 무자를 일본어 발음인 「무샤」가 아니라 한국어의 발음 그대로인 무사(ムサ)라고 표기했다.
이처럼 고류유술 근원이 신라의 장보고 후예인 신라계도래인이라는 사실은 유적 및 문헌자료 등의 사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일본으로 이주한 장보고(신라명신) 후예 신라계도래인들은 고류유술 무형의 문화유산을 통해 무예실제의 이치와 사상을 담아 무사도를 완성시켰다. 신라화랑도와 장보고(신라명신)의 후예 신라계도래인 실전격투의 고류유술을 온고지신과 법고창신 아래 전승 및 재현과 더불어 정통성 및 전통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나아가 실전격투 고류유술의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무예실제의 극치와 사상의 이치인 그 위대한 가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