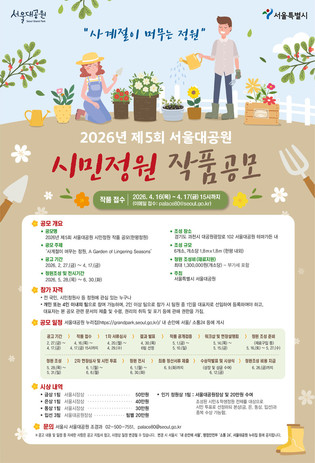사모펀드 지분, ’11년 14.4% → ’21년 21.6%, 7.2%p 증가
오너 지분, ’11년 43.2% → ’21년 42.8%, 0.4%p 감소
사모펀드, 경영권 보호해주는 재무적 투자자에서 위협 세력으로 돌변 사례도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차등의결권 도입 등

지난 10년간 사모펀드 지분 증가폭 가장 커, 오너 지분은 감소 자산 100대 기업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들의 지분을 살펴보았을 때, 사모펀드 보유 지분이 2011년 평균 14.4%에서 2021년 21.6%로 증가폭(+7.2%p)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지분도 7.4%에서 8.7%로 1.3%p 증가한 반면, 오너 지분은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오히려 0.4%p 줄었다.
< 자산 100대 기업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들의 지분 변동 >
지분 소유자 | 2011년 | 2021년 | 지분증감 |
오너 | 43.2% | 42.8% | -0.40%p |
사모펀드 | 14.4% | 21.6% | +7.20%p |
국민연금 | 7.4% | 8.7% | +1.30%p |
법인주주 | 12.0% | 10.8% | -1.20%p |
정부 | 17.1% | 20.5% | +3.40%p |
우리사주조합 | 6.4% | 7.4% | +1.00%p |
합계 | 24.7% | 24.8% | +0.10%p |
지난 10년간 최대주주 지분 변동, 사모펀드 큰 폭(16.4%p) 증가 2021년 기준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등(이하 ‘사모펀드’)이 최대주주인 6개사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6%에서 2021년 60.0%로 대폭(16.4%p) 늘었다. 정부가 기업 M&A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금융자본의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또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도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소폭(국민연금 +1.4%p, +정부 0.6%p) 증가했다. 반면 최대주주가 오너 기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0.4%p 감소했다.
< 2011년 및 2021년 최대주주 평균지분 변동 (소유자별 비교, %) >

사모펀드, 사업재편의 협력 파트너에서 경영권 위협세력으로 돌변하기도 지난 10년간 조사대상 100곳 중 경영권이 변경된 기업이 10곳인데 이 중 4곳(롯데손해보험, 유안타증권, 대우건설, SK증권)을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기업명 | 2011년 최대주주 | 2021년 최대주주 | 구분 |
롯데손해보험 | 호텔롯데 | 빅튜라(사모펀드) | 롯데그룹 금융계열사 정리 계획에 따라 2019년 사모펀드에 매각 |
유안타증권 | 동양인터내셔널㈜ | 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Private Limited | 외국 사모펀드에 매각 |
대우건설 | 금호그룹 | 케이디비인베스트먼트제일호유한회사 | 금호그룹이 2011년 KDB PE에 매각 |
SK증권 | SK네트웍스 | 제이앤더블유 비아이지 유한회사 | 2018년 SK㈜가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보유지분 전량 매각 |
미래에셋증권 | 산은금융지주 (舊 대우증권) | 미래에셋캐피탈 | 산은 보유지분 매각 |
NH투자증권 | 우리금융지주 | NH투자증권 | 2011년 당시 우리금융 소유였고 이후 NH에 매각 |
동양생명 | 보고제이의일호투자목적회사 | Dajia Life Insurance(舊 中안방생명보험) |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을 해외에 매각 |
한화손해보험 | 대한생명 | 한화생명 | 한화그룹이 인수 |
HMM | 현대엘리베이터 | 산업은행 | 현대상선 파산에 따른 채권 |
하이투자증권 | 현대미포조선 | DGB금융지주 | 현대중공업그룹이 2018년 DGB금융지주에 매각 |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매각할 때 이를 사모펀드가 인수한다거나,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긴급자금을 수혈해주는 등 사모펀드의 역할은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움과의 분쟁사례에서 보듯, 초기에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자에게 우호적이다가 이후 주주간 계약을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교보생명 경영권 위협 사례
교보생명은 2019년 사업보고서부터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로 어피니티컨소시움과의 주주 간 계약사항을 공시하고 있음
1.과거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가 대우그룹 붕괴로 2011년 한국자산공사에 넘어감
2.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움(이하 어피니티)”이 주당 24.5만원에 인수(매입비용 1.2조원) →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은 어피니티컨소시움과 주주 간 협약*을 맺음. 이때까지 어피니티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함
*교보생명 기업공개가 무산될 경우, 신 회장이 어피니티측 지분 24%를 되사는 조건(풋옵션)이며, 어피니티측은 그 대가로 24%의 의결권을 신 회장에게 위임
3.IPO 무산을 이유로 2018년에 어피니티는 주당 40만 9,912원(총 2조 122억원)에 주식을 다시 매수할 것을 요구하며 풋옵션 행사→신 회장이 가격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아 불수용
4.어피니티는 동 건에 대해 ‘19.3.20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1차)했고 ’21.9.1 결과 확정(판결내용:풋옵션 계약은 유효하나, 어피니티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주당 40.9만원은 양측 간 합의 금액이 아니므로 불인정)
5. 한편 어피니티측이 풋옵션을 행사한지 한 달 후 KLI도 똑같이 신회장에게 풋옵션(주당 39만 7,893원)을 행사하고 국제중재까지 신청 → ’22.6.9 ICC는 풋옵션 평가보고서의 적정성을 문제로 신회장이 매수의무 없음을 재차 확인함
6.교보생명 입장: “어피니티측과 KLI의 행보는 적대적 M&A 시도로 볼 수밖에 없음”
*어피니티측 풋옵션 행사 가격 41만원(실제 주당 가치의 2배 초과)은 신 회장이 교보생명 경영권을 넘겨야 하는 수준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강제 집행되는 신 회장 주식(34%)과 자신들의 주식(24%)을 합쳐 총 58%의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시나리오를 계획했다는 것이 교보생명 측의 판단임
*특히, 어피니티측과 KLI가 동일한 가치평가기관(안진회계법인)을 통해 과도한 풋옵션 가격을 산출토록 지시하고 한 달 사이에 나란히 풋옵션을 행사한 것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신 회장의 경영권을 노리고 사실상 공조한 것으로 보고 있음
7.통상 적대적 M&A는 공격세력이 경영권 탈취를 알린 상황에서 공개매수(Tender Offer)나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을 펼치지만, 교보생명 사례는 우호지분이던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 공격 세력으로 변한 신종 사례임
정부가 토종자본을 육성하고 해외 PEF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자본시장법상 ‘10% 보유의무 룰’을 지난해 폐지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美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2019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처럼, 이제 국내 사모펀드들도 더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 경영권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업 오너, 다양한 경영권 공격에 노출. 대등한 경영권 경쟁환경 만들어야
기업 오너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으나, 이를 방어할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법상 ‘3% 룰’ 때문에 주요주주 간 경쟁에서 최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2003년 소버린과 SK 간 경영권 분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지분 쪼개기’로 보유지분 전량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03년 소버린 vs. SK 경영권 분쟁 사례 >
소버린은 ‘03.4월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주) 주식 14.99%를 집중 매입
이후 소버린은 감사위원 선출시 3%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미리 5개 자회사에 2.99%씩 지분을 분산시킴 (소버린 요구사항:경영진 퇴진, 부실계열사 지원 반대, 배당 확대 등) → SK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약 1조원을 소진
소버린은 2년 뒤 투자액의 5배인 9,459억원을 주식매매차익과 배당금으로 거두고 철수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가며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기업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경영권 공격세력과 방어세력이 경영권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