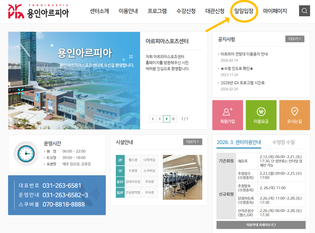|
| ▲ |
이러한 공수도 기술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사람이 최배달이다. 또한 그는 이에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사상과 실천을 첨가 시켜 공수도의 혁명을 불어 일으켰다. 그것이 극진 공수도이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입식 타격기의 무도로 발전했다. 그렇다면 최배달의 입산 수도와 무도기행과정에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五輪書』가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극진 공수도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는 당대의 고수들과 대결하여 얻은 경험을 승화시켜 새로운 무도를 탄생시킨다. 그가 탄생시킨 것이 바로 니텐이치류(二天一流)이다. 그의 영향을 받은 최배달은 실전 무도인 ‘극진공수도’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검도 교우류의 종사 요시요카 가문의 60여 명의 무사들과 단신으로 대 혈전을 벌인 것과 배달이 40여 명의 고수들과 마사시노 대혈전을 펼친 것 또한 매우 흡사하다.
게다가 삶 자체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았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의 무도가 매우 실전적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병법 36개조 만리일공(萬理一空)을 이해하는 개념도 같다.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五輪書』의 실전에 대한 내용이다.
1. 지닌 수단을 모두 이용하라.
2. 하나보다는 둘이 유리하다.
3. 사람의 손은 하나가 아닌 둘이다.
따라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는 양 팔로 쌍검을 쓰는 니텐치류(二天一流) 검술을 창시했다. 그의 출현 전까지는 일본 무사들은 검을 하나만 이용하여 대결했다. 당시의 무사들은 검 하나만 쓰는 것을 무사의 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배달이 극진 공수도를 창시할 때 기존의 대련을 혁파하고 실전으로 바꾸어 이단으로 몰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 역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범수학(2003), 『This is 최배달』, 찬우물 출판사). 왜 최배달이 실전을 중요하게 생각 했는지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五輪書』 내용이다.
1.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이 마지막 적이다.
2. 싸움은 이번 한 번 뿐이라고 생각하라.
3. 목숨을 건 싸움에서 이번에 지지만 다음엔 이긴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번에 지면 다음은 없다. 이미 그때 적에게 죽었기 때문이다.
최배달도 ‘다음은 없다’는 말을 자주 썼다. 그는 ‘상대 고수와 생사를 건 싸움에서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그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다’라고 하였다. 『五輪書』 의 인용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이 보인다.
1. 승리에 우연이란 없다.
2. 일천 일의 연습을 단이라 하고 일만 일의 연습을 연이라 한다.
3. 이 단련이 있고서야 비로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배달은 무도의 고수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는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하루 아침에 고수가 될 만큼 실력을 쌓는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五輪書』의 내용이다.
1.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
2. 견하지 말고 관하라.
3. 사물의 겉을 보지 말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
4. 검으로 적을 당기기(찌르기) 전에 먼저 상대의 눈으로 당겨라(찔러라)
5. 고수는 겉과 속을 보고 느낀다.
최배달이 『五輪書』를 접한 이후 변화한 그의 삶의 철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는 엄격하게 자신을 추구하는 인간을 언제나 존경한다. 가난해도 좋다.
2. 단지 하나의 목표에 목숨을 걸고 정진하는 인간은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답다. 그런 인간은 진정 숭고하게 보인다.
3. 세상은 넓고 고수(高手)는 많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내 선생이다.
4. 천일의 수련으로 초심이 되고 만일 수련으로 극에 도달한다.
5. 실천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며, 신용이 없으면 존경이 없다.
6. 머리 낮게 눈은 높게 입은 좁게 삼가 마음을 넓게 효(孝)를 원점으로 타인을 이롭게 한다.
독행도(獨行道)는 홀로 가는 길 혹은 홀로 행한 도(道)를 의미 한다.
이것은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사망 직전에 자신이 걸어온 길(道)에 관한 기록이다(이진수(2000), 「일본무도의 연구 - 五輪書를 중심으로-」, 한국철학회지).
1. 세상의 도를 거스르지 않았다.
2. 몸의 즐거움을 탐하지 않았다.
3. 여러 일에 자만하지 않았다.
4. 몸을 가볍게 세상을 무겁게 생각하였다.
5. 일생 동안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6. 일함에 후회하지 않았다.
7. 선악으로 남에게 핑계대지 않았다.
8. 어떤 길에도 이별을 슬퍼하지 않았다.
9 나와 남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다.
10. 戀慕하는 길에 마음을 멈추지 않았다.
11. 사물에 빠져 즐거워하지 않았다.
12. 사택에 있을 때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
13. 몸을 위해 미식을 먹지 않았다.
14. 골동품을 가지지 않았다.
15. 몸에 꺼리는 것이 없다.
16. 兵具는 각별하게 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없다.
17. 道에서는 죽음을 슬프게 생각지 않았다.
18. 늙은 몸에 보물을 갖고픈 마음이 없다.
19. 몸은 버리되 명예는 버리지 않았다.
20. 언제나 병법의 道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상의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 좌우명들은 본인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본 자기반성의 지침이었다. 도(道)란 이 같은 평범한 자기반성 속에서 싹트고 자란다. 그렇다면 최배달은 『五輪書』를 읽은 후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지론들이 있었을까!
1. 무도는 예로 시작되어 예로 마무리되므로 항상 예의를 지켜야 한다.
2. 무도의 탐구는 절벽을 기어오르는 것과 같으므로 쉬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
3. 무도에는 모든 면에 선수가 있지만 사사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은 없다.
4. 무도에서 금전은 필요한 것이지만 금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5. 무도에서는 자세가 중요하므로 무슨 일을 하든 늘 자세를 단정히 해야 한다.
6. 무도는 천 일을 시작 단계로 하여 만 일을 연습단계로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7. 무도에서 자기반성은 기예가 숙달되는 전기가 된다.
8. 무도는 팀워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련할 때에는 사심을 버려야 한다.
9. 무의 길은 점에서 시작해서 원으로 끝난다.
10. 무도에서의 비법은 체험에서 나오므로 체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11. 무도에서 신뢰와 감사하는 마음은 늘 풍성한 수확을 안겨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상으로 최배달이 『五輪書』를 접한 후 그의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는 『五輪書』 에 나타난 만리일공(萬理一空)의 깨우침을 통해 현시대의 무도인에게 진정한 고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정한 무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무도가 불교로부터 받은 영향은 참으로 심대하다. 불교와 유교는 물론 옛 군법의 용법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체험만 기록하였다는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五輪書』 에서조차 그 검술의 궁극을 만리일공(萬理一空)이란 선어를 빌어 이를 표현한 것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쿠카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2~1616)시대부터 무사들의 사상적 기반이 선불교(禪佛敎)에서 유교로 전환되었다. 이때부터 무사들의 의식과 삶은 유교적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 더 많은 부분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전환된 것이다. 에도시대에 접어들어 도쿠카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무사세계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원하여 무사들이 올바른 윤리관을 갖게 하기위해 문교정책을 시행하였다. 무사들의 생활과 수련에는 그 이전에 유행하였던 선불교의 사상과 새로이 대두된 유교사상이 공존하게 된다(이진수(2000), 「일본무도의 연구 - 五輪書를 중심으로-」, 한국철학회지).
이 당시 정권의 이데올로기인 유교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영향력이 강화된 유교가 막부에 의한 『武家法道』라는 규범으로 무사들의 삶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당시 무사들의 의식과 윤리, 그리고 행동을 규정했던 제반규범과 가치관을 집약한 것이 무사도이다. 이러한 에도(江戶)시대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五輪書(萬理一空)』에는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독창성 보다는 유불선의 사상이 있어 다고 일부 학자들은 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의문점들은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일공(萬理一空)(이진수. 2004), 韓國道敎文化硏究, 『萬理一空에 관해』, 우리가 『五輪書』에서 추출한 만리일공(萬理一空)의 의미이다. 공은 검술을 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수련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다. 공의 경지는 궁극(窮極)의 검술을 체득한 사람의 밝고 곧은 마음, 얽매임이 없는 자유로운 신심이다.
이를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는 ‘주저함이 없으며 조금의 흐림도 없어 어두운 구름이 활짝 갠 경지’ 라고 했다. 공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제가 마음먹은 대로 검술을 행할 수 있으니 싸움에서 질 수가 없다.)은 불교 일반에서 말하는 일절공(一切空), 제법개공(諸法皆空)의 이념과는 그 의미기 달라 검술의 무상성(無常性)을 강조한 대목은 전혀 없이 오로지 병법의 상주성(常住性)만을 강조하고 있다. 병법가전서에 자주 보이는 무심(無心)이란 용어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부동심(不動心)이란 용어는 ‘움직임이 없는 마음’이라 일본어로 풀어 쓰고 있다.
다음 칼럼에서 계속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