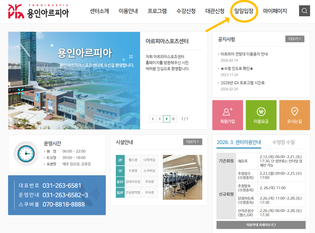|
|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
천신진양류(天神真楊流)는 기우우위문정족(磯又右衛門正足)의 호족인 류관재(柳関斎)가 창안했다. 기우우위문(磯又右衛門)의 처음은 추산의시(秋山義時)에 요오신류(楊心流)를 배운 후에 진신도류(真神道流)를 창안했다.
그는 전장에서 구미우찌(組討)의 여러 유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급소 지르기를 수련하여 실전 격투유술인 실용적인 신체기법체계를 창시했다. 실전격투유술인 요오신류(楊心流)와 텐진신유류(天神真楊流) 요오신류(楊心流)를 하나로 통합한다. 특히 텐진신유류(天神真楊流) 가전서(家全書)에는 미나모토 마사노리(源正德), 미나모토 마사타시(源正足)라는 두 인물인데 통일신라의 후손 신라삼랑 원씨(源氏) 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 우우위문(又右衛門)은 기슈한시(紀州藩士) 와카야마(和歌山)현과 미에(三重)현 다이묘(大名)의 신하)로 이세송판(伊勢松坂)(삼중(三重)현의 송판(松坂)시)의 사람이다. 동유파의 성립은 문구년간(文久年間)의 1861~1864년이며 메이지(明治)의 1864년 무렵에 생각된다. 이전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진신도류(真神道流)와 같은 것이 많았다. 또 유술(柔術)에서의 체력이나 근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류(起倒流)나 진신도류(真神道流)와 같은 인용하여 수련 중에 힘을 강하게 넣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시대의 각종 모든 유술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말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신체기법을 하는데 미숙하여 힘을 쓰면 사지신체(四肢身体)가 굳어져 자유가 없어져 유파의 의식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면 기법이 숙달되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힘은 조금도 나쁘지 않는다. 즉 상대를 향하려면 반드시 상대를 적대시(敵對視)해서는 안 된다. 기(氣)를 전신으로 채워서 어깨에 힘을 주지 않도록 전신을 부드럽게 하여 상대의 움직임에 응한다.
어떠한 강한 상대에 대해서도 상대의 힘에 반항하지 않고 흐르는 강물위에 나무 조각과 같이 몸을 움직이면 자유롭게 되어 어떠한 상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쟁취한다. 그 외에 부동심(不動心)이라든지 무아무심(無我無心) 등 몸 깨침의 깨달음을 가져 심법(心法)을 말하고 있지만 이 점은 종구(宗矩)의 가전서(家伝書)나 택암(沢庵)의 부동지(不動智) 주장에 더 가깝다.
이러한 마타에몬(又右衛門)은 문구(文久) 1863년 7월 15일에 60세 나이에 사망한다. 하지만 일부 일설에는 78세라고도 한다. 차남의 우일랑정광(又一郎正光)이 2대를 이었지만 3대 우우위문정지(又右衛門正智)는 정족(正足)의 문인 처음 송가청좌위문(松家清左衛門)과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가 입문 수행한 복전팔삼조정의(福田八三助正義)는 3대에 이른 정지(正智)의 제자이다.
그렇다면 텐진신유류(天神真楊流)의 신체기법 및 양생법과 사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보인다. 《家元議定書》에는 부이(夫以)가 가진 유술자의 무사 근원에 있어서 치국(治國)을 기초로 하여 장사병립(將士並立)의 요(要)로 하여 약(弱), 강(强)을 제압한다. 그가 역중(力衆)에 월(越)원하는 무사에게 승리(勝利)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술(術)이다. 즉 역중(力衆)이 매일의 집행(執行)을 가지고 향할 때는 힘의 한(限)이 있고 술(術)은 무한(無限)이다.
중단거포(中段居捕)의 동자(動者)는 잡고 못 움직이게 하여 동(動)은 자연스럽게 죽이고 죽으면 술(術) 이활(以活)해진다. 이것을 살활자재(殺活自在)이다. 그 능(能)을 배우고 오(奧)를 극(極)하는데 있어서는 요사(夭死)의 것을 활(活)하게 한다. 여기를 가지고 그 오묘(奧妙)를 모르는 것은 직면 갈(渇)에 망(望)하여 정(井)을 천(穿)하여 나무로 인해 물고기를 구하는 것에 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양류(真揚流)의 파(頗)하는 큰 것이다.
장(場)에 중단(中段) 십팔개(箇)의 수수(手數) 최천(最天)의 십팔 숙성(宿星)에 따라 당류(当流)에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費)가 가능하다.
유술경로인지권(柔術経路人之卷)은 송풍(松風)의 살(殺)은 후(喉)가 부딪치는 양(陽)의 위치이다. 차경(此経)은 기왕래(氣往來)하는 곳의 도로(道路)이다. 인간 상초(上焦)에 목 속에 두 개 좌우로 갈라져서 관(管)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수곡(水穀)의 도로(道路)이다. 식관(息管)이라 하는 것이 있다. 일척(一尺) 이촌(二寸) 두절(九節)이 있고 폐(肺)의 장(臟)에 계통하여 있는 것이다.
이 뒤에 십율 비하는 인간의 음성은 차폐(此肺)로부터 나온다. 활(活)은 칙(則) 대장(大膓)을 마회(摩回)를 이룬다. 제경(諸経)의 당(当)을 가지고 알 수 있다. 촌우(村雨)의 살(殺)은 인(咽)이 부딪치는 음(陰)이다. 위에 통계(通系)하여 수곡(水穀)의 도로(道路)이다. 모든 음식을 위(胃)에 들어간다.
위(胃)의 부(腑)는 비(脾)의 아래에 수(随)하여 위치한다. 수곡(水穀)의 집어놓는 것 상완(上脘)이라 한다. 제(臍)의 상오촌(上五寸) 수곡(水穀) 소화(消化)의 지위(地胃) 정중중완(正中中脘)이라 한다. 제상사촌(臍上四寸)은 음식 부숙(腐熟)하여 소장에 전해지는데 이를 유문(幽門)이라 한다.
이것을 제상(臍上) 이촌(二寸) 하완(下脘)이고, 소장의 상구(上口)이다. 활생(活生)은 비(脾)의 지(地)를 마회(摩回)하여 잡아야 한다. 총(㹅)은 이 뜻을 가지고 알 수 있으므로, 여(余)는 하는 것이 이것에 준한다. 전(電)의 살(殺)은 단(胆) 부(腑)에 부딪친다. 일월(日月)의 위치에 가깝다. 단(胆)은 간(肝)의 사엽(四葉) 장하여 각별한 것이다. 위(胃)는 수곡(水穀)을 넣고 소장은 받아 방광은 액을 받고 대장은 조박(糟粕)을 받고 오장 모두 안 받는 것이 없다. 다만 떨어져 수곡예탁(水穀穢濁)을 안 받고 간엽(肝葉)의 사이에 있어 그 정한 천기(天氣)를 지키는 자이다.
인간형체(人間形體)의 기(氣)는 강유(剛柔) 모두 단(胆)으로부터 안 나오는 것이 없다. 이것에 의하여 인력(人力)은 단(胆)을 이루는 것이다. 차살(此殺)은 속하기 때문에 이를 도처(稲妻)라 한다. 인간강유(人間剛柔)의 기사(氣司)하는 것이 원경(源経)이라 한다.
월영(月影)의 살(殺)은 간(肝)에 부딪친다. 간(肝)의 형(形)은 목엽(木葉)과 같고 이를 칠엽(七葉)이 있다. 사엽(四葉)은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음(陰)의 부(部)이다. 삼엽(三葉)은 왼쪽으로 붙고 양(陽)의 부(部)이다. 음(陰)은 우(右)의 양(陽)은 기(寄) 이것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차살(此殺)은 대사(大事)의 당(当)이다.
즉 항상 심득(心得)이 가능하다. 간단(肝胆)의 기문(臟腑)은 모두 인간의 강강(剛強)에 나오는 것이다. 월영(月影)은 기문(期門)의 주변에 가깝다. 가장 조(稠)하여 경(経)에 부딪칠 때는 경력(経力)을 가지는 일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思)의 밖에 있는 토식(吐息)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심득(心得)해야 된다.
안하(鴈下)의 살(殺)은 양유(兩乳)의 주변을 찌르고 부딪친다. 차경(此経)은 칙(則) 심폐(心肺)의 이장(二臟)에 철(徹)한다. 심폐(心肺) 두 개는 상(上)에 위치하여 하초(下焦)의 예탁(穢濁) 기(氣)를 받지 않는다. 당(当)하는 경(経)은 양쪽의 각각 일촌(一寸)에 있다. 이것의 제일 마음의 장에 부딪친다. 심(心)의 장은 배 안에 허리 안에 있고, 상(上)의 위치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하여 격막(隔膜)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폐(心肺)의 두 개는 하초수곡(하焦水穀)의 예기(穢氣)를 안 받는다. 오장 안에 있어서 심(心)의 장은 지성군(至誠君)의 왕(王)의 위치이다. 신명(神明)의 우(㝢)하는 것이 일체(一體)에 신령(神靈)이다. 밖의 장부는 이것 심의 장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이다. 땅에 조금 부딪쳐도 심답(甚答)하는 것이다. 이것이 칙(則) 천진(天眞)의 기(氣)에 이루는 것이다.
명성(明星)의 살(殺)은 대장(大腸) 방광(膀胱)의 이부(二府)에 부딪친다. 제상(臍上) 일촌(一寸) 정도의 이것보다는 물은 방광(膀胱)에 하행(下行)하여 전음에 나온다. 조박(糟粕)은 대장(大腸)으로 행하여 후문(後門)에 나온다. 이것으로 인하여 조(稠)하게 부딪치는 부(腑) 이변(二便)을 외우지 않고 나온다.
대장(大腸)은 오른쪽에 위치하여 있다. 그 뒤에 반(蟠)하고 있는 것은 음교(陰交)의 지(地)라 하여 알 수 있다. 오토(烏兎)의 부딪침은 양안(兩眼)이다. 머리의 원(圓)은 하늘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일월(日月)이 있고 음양을 알 수 있다. 사람에게 양안 상에 있고 사물이 명백하다. 자류(自流)에 양안兩眼)을 가리키고 오토(烏兎)라 하는 것 일 중에 삼족(三足)의 오(烏)가 있고 월중(月中)에 옥토(玉免)가 있다. 이를 보는 것을 최(最)의 음양(陰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오토호(烏兎号)라 한다. 수월(水月)은 극(極)의 대사(大事)의 살(殺)이다. 일절(一切)의 장부 경로(経路)를 부딪치는 것이다. 차수월(此水月)은 비(脾)와 위(胃)의 주앙상양(中下上陽)에 부딪친다. 이것으로 의하여 일절(一切)의 살(殺)은 차종(此種)을 가지고 도와 줄 수 있다. 이를 신부(神腑)라 한다. 부자(腑者)의 이것은 신심(腎心)의 성(性)을 받는 기경(氣経)을 가지는 생부(生腑)이다. 그리하여 항상 차부(此腑)는 음양(陰陽)에 모두 받아 만풍(万風)의 생(生)을 하는 부(腑)이다. 칙(則)의 숨이 멈추고 조금 사이 장부에 멈추고 보는 사이에 하늘과 같이 되는 것이 부(腑)이다. 대사(大事)의 살(殺)이다. 활생(活生)은 토식(吐息)의 법(法)을 사용한다. 다음 편에서 계속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