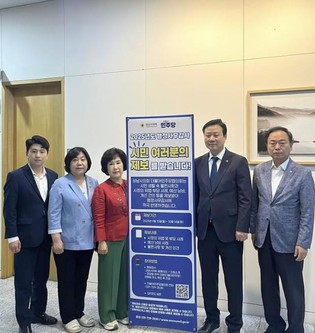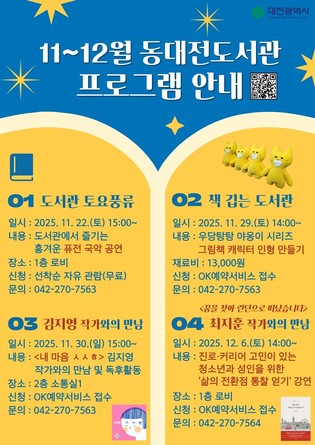|
| ▲ © 세계타임즈 |
그렇다면 도(道)란 무엇인가?
도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연의 도와 인간의 도로 구분된다. 자연의 도는 우주 만물의 생성 운행과 관계하는 도요, 인간의 도는 이 같은 자연의 도를 기반으로 하여 완전한 인간을 지향하는 도다. 인간에게 도는 몸으로 실천하는 방법도 될 수 있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관념도 될 수 있다.
도는 형이상자(形而上者)이다. 형이상이란 형체가 없어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즉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실천이 없으면 도가 아니다. 서양이 형이상학이 실천보다는 사변(思辨)쪽으로, 기울어진 것과는 전혀 다르다. 서양의 형이상학은 물체를 떠난다. 다만 관념 만으로서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형이상학은 형(刑), 즉 형체(形體) 그 자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형체의 본질을 가리키는 의미이다.
불교에서는 ‘신심일여(身心一如)’, 유교에서의 ‘주일무적(主一無敵)’의 경지는 인간의 실천적 본질에 대한 표현이다. 이것은 몸의 기법을 표현함과 동시에 마음의 기법이기도 하다. 실천과 관념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다.
형(形)은 마음을 포함한 것이므로, 물체적 움직임이 없어도 상승이 가능하다. 몸의 기술에서 마음의 기법으로 나아가든지 마음을 먼저 먹고 몸을 다스리는 쪽으로 나아가든지 그것은 수행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바로 도이다. ‘도를 닦는다’는 말은 성립한다. 인간의 형체, 즉 몸을 수행시켜 더욱 고차원적이고 전체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도의 근본 원리라 생각된다.
이 맥락에서 무도가 탄생하게 된다. 각종 무도에 보이는 도는 인간을 더욱 고차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처음부터 무도가 본연의 무도로 정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도라는 용어가 무술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한국의 경우 무도라는 용어는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도입된 외래어에 불과했다. 물론 일본의 경우도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어 새롭게 만들어 낸 것에 불과했다.
중국에서 무도란 일본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무술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무이예(文武二藝)’ 혹은 ‘문무이도(文武二道)’라는 중국어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무도는 군사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일본에 유입되어서는 무사도로 재해석되어 사용된다.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초까지 가마꾸라(鎌倉) 시대에는 무가(武家)가 일본을 지배하던 시대였다. 이 시대의 무도는 무가의 지도자가 지켜야할 도리라는 의미였다. 지도자로서의 마음가짐, 무사로서의 긍지가 이때의 무도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무도와는 그 지향하는 바가 엄격히 다르다.
오늘날의 우리는 무도라는 용어를 무기(武技) 혹은 무술의 의미로 맨몸이나 궁, 마, 창, 검 등을 사용해 자신을 지키고 적을 이기는 모든 기술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무도=무술’ 이라는 등식의 성립은 20세기에 들어와 확립된다. 검도, 유도, 궁도에서 보이는 도의 호칭은 그대로 격검, 유술, 궁술의 의미와 다름이 없다. 물론 15세기 후반 직심류(直心流), 기도류(起倒流) 등은 유도로 호칭된 바도 있었다. 이때의 유도는 오늘의 강도관 유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실제로 무사(武事)는 문노의 전기에 그 용어가 보인다. 화랑도들이 관장한 한 부문에도 현묘(玄妙), 예사(禮事) 등과 함께 무사(武事)이다. 선도에 대칭되는 말로 무도가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도 선사(仙事), 즉 화랑도가 치러야 할 국가의 제사에 관한 측면과 구별하기 위해 20세 풍월주 예원이 강조하여 실행한 랑정(郞政)의 슬로건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
물론 이때의 무도는 전쟁 기술로서의 무사를 말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 형이상학적인 도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격검을 좋아한 문노의 경우, 그의 방정한 성격, 의협을 좋아하고, 상벌에 구애받지 않는 대인의 풍모 등은 본국검을 수련하여 얻은 그만의 인격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한국적 본국검도의 이념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비보랑의 찬(贊)에 나오는 ‘검도대천(劍道大擅)’이다. 문노를 묘사한 ‘호격검(好擊劍)’의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검도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화랑세기에 보이는 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선도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정치(精緻)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신라의 선도가 중국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질(異質)의 선(仙)으로 신라만이 가지는 독특한 선이다. 신라의 선은 조상신을 받드는 나라의 큰 제사를 주관하는 선이다.
화랑세기에 보이는 무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본국무예를 연마함으로 하여 획득되는 어떤 정신적인 사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용어상으로만 보면, 20세기 초에 성립된 일본식 한자를 사용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실제의 의미는 무사(武事)를 뜻하고 있다. 이것은 혼도(婚道)가 혼사를 의미하는 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내포하지 않고 있음과 같다. 무도 혹은 검도란 특정한 용어의 사용만을 놓고 화랑세기가 위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